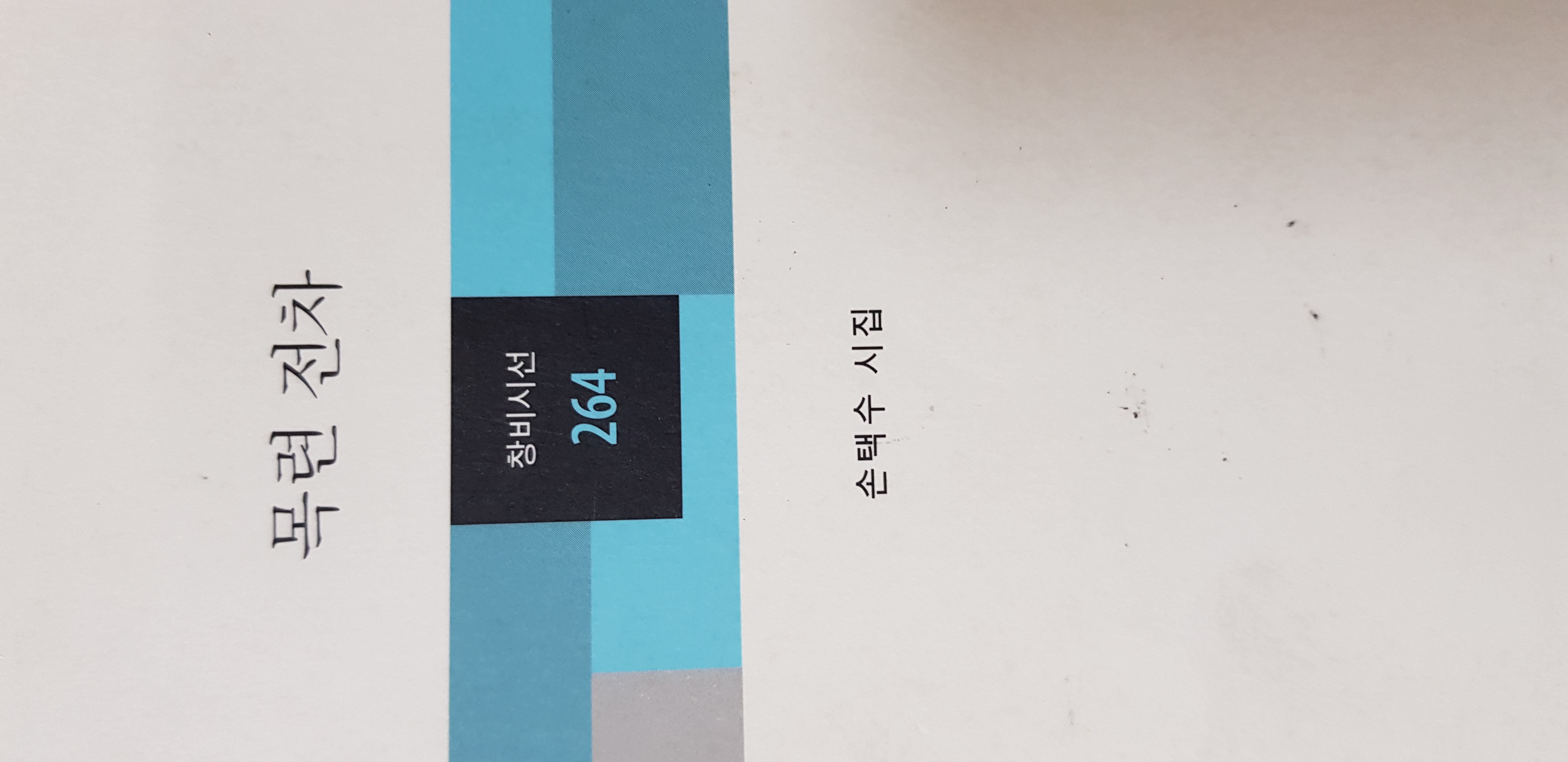
창고 배출구에서 옥수수가 떨어져내린다. 쏟아져내리는 옥수수 속에 발목과 날갯죽지가 파묻히는 줄도모르고 후다다닥 길게 줄을 이은 수송트럭 속으로 빨려드는 비둘기떼, 부리 속에 집어넣은 알곡에 콱 기도가 막힌 채 죽어간다. 한 트럭에서 대여섯 마리씩은 나오죠, 공포탄을 쏴봤지만 막무가내예요. 부산항 양곡 전용부두 운전사가 포장을 덮으며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할 밤의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동안, 뒤늦게 온 몇몇은 다리를 전다. 끊어져나간 발목 뭉특해진 끝으로 길바닥을 짓찧으며 절룩절룩 떨어져내린 알곡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간다.
-------------------------------------
도시를 벗어난 곳에서 삶의 자리를 꾸려가는 시인들에게 백석과 지용의 목소리는 벗어나야할 굴레일까 아니면 우러러야할 깃발일까? 농촌이건 어촌이건 산골짜기건 촌에다 몸을 부려놓은 시인들의 목소리에는 어쨌든 백석이나 지용의 흔적이 묻어있다. 말투, 냄새, 풍경 같은 곳에서..
물론 그 시인들의 모든 시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어떨 땐 드물게 또 어떨 땐 가끔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그만큼 옛적 두 시인의 체취나 그늘이 깊은 탓이고 또 넘어서지 못할 정서란 말도 될 것이다.
이 시인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시집을 읽다 어느 한 편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 적어보는 것 뿐이다.
내게는 시골의 정서가 없다. 기껏 나고 자란 대구의 변두리, 다 낡은 도시와 시골이 어설프게 섞인 가난한 풍경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시골의 시들은 늘 동경을 낳는다. 그게 결코 동경할 만한 서정이 아니라 살이 찢기는 아픔의 정한들일지라도 그 질박한 배경에 마음이 가는 것이다.
손택수라는 시인을 나는 처음 알았다. 시도 처음 읽었다. 좀 까다롭게 굴자면 잘 아는 시인 세 사람 정도가 버무려진 시들이라는 느낌이 처음에는 들었다. 고향집, 일족들, 주변의 생명들, 노동과 궁기의 역사 같은 것들이 그랬다. 글의 서두에 백석과 지용을 들먹인 것도 그 탓이리라.
하지만 시집 한 권을 다 읽고 나서는 그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詩는 사는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살아갈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니까. 오래된 흙냄새가 아직도 발목에 남은 시인이 바라보는 세상은 걸어온 길에 희미하게 찍힌, 마른 황토 발자국 같은 것, 또는 비린내 풍기는 바닷 바람 같은 것 아닐까? 비는 일생토록 내리고 바람 또한 배고프게 불고, 그때마다 곧 지워지지만 결코 없어지지는 않는 발자국. 그 깊은 흔적들을 어디론가 날리고 있는 마음들이 시집으로 묶였다 생각해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백석이나 지용은 문풍지에 불과하다.
---------------------------
海松
바늘 끝이 녹슬었다. 녹슨 바늘 위로 실비 내린다. 사내는 옷을 깁고 있다. 소주병 나뒹구는 툇마루에 앉아 침 묻은 실을 바늘에 꿰고 있다. 그물옷 몇벌 바다에 지어주고 사내에게 남은 건 헐벗음뿐이다. 굽은 허리와 쿡쿡 쑤셔오는 뼈마디뿐이다. 한 평생 바다를 바라보고 사는 몸은 彎을 닮는가. 지그재그 제 목숨에 취해 만을 향해 밀려오는 파도를 닮는가. 누런 바늘잎들 떨어지는 바다쪽으로 사내가 허청허청 걸어간다. 그물옷 속 등 굽은 바다가 시퍼렇게 일어서고 있다.
'이야기舍廊 > 詩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불화하는 말들 /이성복 (0) | 2020.05.28 |
|---|---|
| 오늘의 냄새 / 이병철 (0) | 2020.05.27 |
| 모래 알갱이가 있는 풍경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0) | 2020.05.18 |
| 끝과 시작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0) | 2020.05.18 |
| 현대문학 2005 (0) | 2020.05.04 |